진보정당, 10% 득표율로 항상 5석 이상 확보
민주노동당은 헌법소원을 통해 2001년 정당명부제도를 실현시켰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8% 넘게 득표하여 국회 17석을 지닌 자민련을 제쳤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에선 13% 득표로 10석을 얻었으며 노회찬 사무총장이 김종필 총재을 제치고 비례 끝번으로 당선됐다.
이후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은 10% 내외의 득표율로 항상 5석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2012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탈당한 진보신당 지도부들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의 ‘묻 지마’ 선거연합, 그리고 정당명부에 힘입어 무려 13석을 획득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정당명부제 때문에 흥했다가 정당명부제로 망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에 몰입하지 않겠다.”며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겸직금지제도를 도입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의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개인플레이’에 주력했다. 2008년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은 지도부가 의원을 겸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인 지도부에게 너무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원내지도부와 원외지도부가 조화를 이룬다는 취지가 널뛰기를 하다 무색해진 셈이다.
2004년 비례대표 후보 선거는 당원이 남녀 각 2인 총 4표를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6년 지도부 선거 이후 특정 세력이 당 내 다수가 되자 소수파에게 돌아 갈 비례의석이 거의 없게 됐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소수파도 비례후보에 당선될 수 있도록 1인 2표 제도가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결국 비례대표 당선권에 멀어진 소수파는 점차 분당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모순되게도 분당한 소수파들이 통합진보당으로 다시 합류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 의석 때문이다. 분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한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은 2008년 총선에서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의석도 전멸했다. 반이명박 전선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단일화 덕분에 지방의석을 대거 획득한 진보신당은 지역구 야권 후보단일화와 정당명부 득표율 저지선(3%) 돌파를 목표로 전격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단일후보가 되려는 당내 경선, 비례대표 경선이 과열되면서 부정선거 시비로 통합진보당은 폭력사태와 경찰의 강제수사 끝에 결국 다시 분당되고 만다.
<2023.3.6. 김장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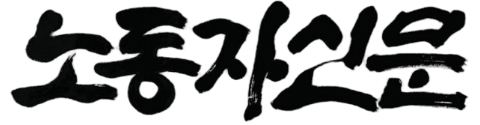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