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인 ‘우리’라는 집단의 실체와 정체 (3)

본문
박현욱(노동예술단 선언)
(20호에서 이어짐)
99%인 ‘우리’라는 집단의 실체와 정체에 대해 문화적으로 답해보자고 했다. 해서 좀 철지나긴 했지만 옛 드라마 얘기 좀 해보련다.
 2009년도에 방영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선덕여왕’을 기억하시는지? 신라를 배경으로 미실과 선덕여왕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이다. 왕족은 아니었으나 실질적 권력을 가졌던 미실이 권력싸움에서 패한 후, 결국 왕이 된 선덕을 찾아가 이런 말을 한다. “세상을 종으로 나누면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신라인 중에서도 선덕을 따르는 자, 미실을 따르는 자, 등 여러 집단으로 나눌 수 있지만, 횡으로 나누면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딱 두 개로 분류된다. 당신과 나는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지배하는 자로서 같은 편이다.”
2009년도에 방영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선덕여왕’을 기억하시는지? 신라를 배경으로 미실과 선덕여왕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이다. 왕족은 아니었으나 실질적 권력을 가졌던 미실이 권력싸움에서 패한 후, 결국 왕이 된 선덕을 찾아가 이런 말을 한다. “세상을 종으로 나누면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신라인 중에서도 선덕을 따르는 자, 미실을 따르는 자, 등 여러 집단으로 나눌 수 있지만, 횡으로 나누면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딱 두 개로 분류된다. 당신과 나는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지배하는 자로서 같은 편이다.”
내겐 꽤나 흥미로운 장면이었다. 미실이 말하는 ‘세상을 횡으로 가르는 선’, 그것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한다. 노동자 동지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노동조합 교육을 할 때 ‘계급’ 혹은 ‘계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신라시대 사람 보는 듯 한 눈길을 종종 느꼈던 터라, 드라마를 통해서일지라도 1천5백 년 전 지배계급의 일원이 지금 사람들에게 진실을 실토하는 듯한 그 장면이 사이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조합원들 계급의식이라곤 1도 없어요.”라며 그런 인식(계급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부탁하는 동지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교육 내용이 좋긴 한데... 그 ‘계급’ 얘기는 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언제 적 계급 얘기요? 하하” “10년 넘게 노조 활동하며 여러 교육을 받아 왔지만 ‘계급’얘기는 처음 듣네요”라는 식의 반응을 더 많이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미실이 말했듯 계급이란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의미한다. 바야흐로 ‘국민주권’시대에 같은 국민 안에서 지배와 피지배라니? 조선시대처럼 강상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노동자는 자본가와 법률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나오는데 ‘계급’ 타령하고 있는 꼴이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져 보일 일이다. 뭐 지금도 예로 든다는 것이 무려 1천5백 년 전을 배경으로 하는 15년 전 드라마이니 말이다.
그래서 나름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장면을 현대물로 재구성 해봤다. 대통령이 되진 못했지만 실권을 장악한 누군가가 그를 탄핵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또 다른 권력자와 나누는 대화로 가정해 보자. “세상을 종으로 나누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등등 또 그 중에서 소위 1찍(민주당 지지자), 2찍(국민의 힘 지지자) 등등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세상을 횡으로 나누면 지배하는 자와 지배 당하는 자 딱 두 개로 나뉩니다. 어차피 우리는 권력을 나눠 갖고 지배하는 자들로서 같은 편입니다.”
음... 이 정도면 똑같은 서사구조로 지금 현 시점을 다룬 현대물 장편 시나리오를 쓴다 해도 시청률 꽤나 나올 듯 하지 않으신지?
문화적으로 답해 보는 99%인 우리의 집단으로서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피지배계급으로서의 계급성이다. 법률과 제도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계급지배 사회이고 노동자는 그 사회의 피지배계급이라는 동일성을 가진 집단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와 변별 되는 노동자 문화의 성격 역시 그 첫 번째가 ‘계급성’이다.
그럼에도 ‘계급’을 말하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일이다. 희한하게도 사회적으로는 대체로 부정되는(당사자들에게서 조차) 계급 담론이 문화의 영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국제적인 상을 휩쓸며 전 세계를 달굴 때,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이 영화가 전면에 내세운 ‘계급 문제’에 주목했는데. 그에 대해 ‘언제 적 계급 얘기냐?’거나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 이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물론 문화예술 영역과 현실 영역을 별개로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인식이 이유이긴 하겠으나, 그보다 의식적인 긍정, 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급’이 실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일 것이다.
말 나온 김에 기생충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앞서 말한 미실의 대사와 기생충 속 자본가(극 중 박사장)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선’이다. 미실이 세상을 횡으로 나누는 선의 위와 아래를 말하듯 기생충 속 자본가 역시 습관적으로 그가 고용한 이들(노동자)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한다. 이 둘이 말하는 ‘선’은 본질적으로 같다. 다만 과거에는 보였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차이가 있을 뿐. 흔히 ‘유리 천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일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사는 노동자에게 계급의 선은 그저 공간적 분리와 진입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유리 천장’과는 다르다.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채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이들이 노동자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 역시 독점하게 된다. 트럼프의 저 유명한 유행어 ‘You’re fired(너 해고야)’가 말해주듯 자본가계급은 한손으로는 노동자의 목줄을 쥐고, 한 손으로는 그러한 힘을 물리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가를 쥐게 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찌 자신의 목구멍을 장악한 이들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심지어 자신의 목구멍보다 더 무서운 아이들, 가족들의 목구멍도 모두 포도청이니 말이다.
맑스가 말했듯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렇다. 미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이들은 선덕여왕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대상이었던 백성들이었고, 기생충 속 박사장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언제나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이 계급으로 각성하고 단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자본가계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서 저들은 노동자들이 계급으로 각성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해서 노동자 문화는 그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 노동자가 계급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마치 보이진 않지만 땅 밑에서 들끓고 있는 용암처럼. (2024.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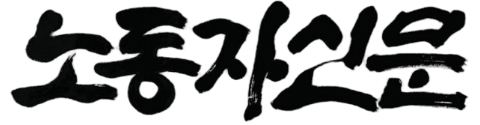





댓글목록0